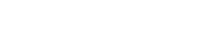스승의 죽음을 전해 듣던 해, 조광조는 스물셋이 되었다. 그사이 열여덟 살에 혼인을 했고, 열아홉 살에는 부친상을 당하여 3년 동안 복服을 입었다. 지아비가 되고 삼년상을 치러냈으니 진짜 어른이 된 것이다. 그동안 그는 다른 스승을 구하지 않고 홀로 학문에 정진했다. 그럴 만한 스승을 찾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문을 격려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. 집권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두 차례의 사화로 일단 생각 있는 자들을 ‘입 다물게’ 하는 데 성공했다. 모여서 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분위기가 꺾인 데다가 실제로 공부 좀 한다하는 이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었다. 그야말로 독재자가 원하던 모습이다.
조광조는 출사하기 전이었다. 이미 십 대 시절부터 과거를 권하는 이는 많았으나 아직 문장을 익히지 못했다는 말로 거절했다고 전한다.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는 뜻이겠다. 유배지의 스승이 기어이 참형을 당하자 마음은 더 가라앉았을 것이다. 갈등하지 않았을까. 그래도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지, 아니면 수기修己에 전념해야 하는지. 일단 학문 속에서 어두운 시절을 견디기로 했다. 과거에 뜻이 없다 해서 공부를 그만둘 이유는 없었다. 오히려 ‘진짜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. 시험공부는 그저 벼슬이나 명예 같은 사욕에 매이기 십상이니까.
문제는 이런 조광조를 비껴 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. 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 공부의 뜻이 무엇이냐고. 이 무렵 그에게 ‘광자’라는 말이 붙여지기 시작한다. 미친 사람처럼 공부에 몰두했다는 말인데, 그런데 이것이 거리낄 만한 일이었을까. 시대가 시대였던지라, 그것이 ‘진짜’ 공부라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. 광자와 한 조를 이룬 듯 따라다니던 ‘화태禍胎’라는 표현이 그 이유를 말해준다. 그 공부가 화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. 그대의 스승을 돌아보라는 뜻이겠다. 이를 꺼려 사이가 멀어진 친지와 친구들도 있을 정도였으나 조광조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. 짐작대로다. 무언가에 미친 사람이 고작 남의 말에 흔들려 정신을 차릴 리 없다.
그렇게 다시 두 해가 지난 병인년(1506년) 9월. 연산군의 폭정이 다할 대로 다한 이해, 마침내 세상이 바뀌었다.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난 것이다. 조광조의 나이 스물다섯, 미친 듯이 공부한다는 그의 이름이 알 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던 때였다. 어디까지 퍼져나갔을까. 당시 전라남도 능성에 살던 열아홉 살의 양팽손梁彭孫이 조광조의 이름을 듣고 찾아왔다는 일화를 보면, 식자들 사이의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고 상세했던 것 같다. 조광조의 본가는 한양으로, 그는 당시 선영이 있는 경기도 용인에 거하던 중이었다. 남도에서 한양 부근까지 광자를 찾아와 배움을 청한 양팽손 또한 그다지 평범한 인물로 보이지는 않는다. (역시나 이 두 사람에게는 남다른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.)
화순군민신문 hoahn01@hanmail.net
 2025.07.03(목) 10:31
2025.07.03(목) 10:31